4.3. 국가에서 교회의 주권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Vrije kerk in de vrije land)는 카이퍼의 주간지 전면에 게시된 모토였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핍박해온 것처럼 비난받아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이퍼는 “하나의 새로운 체계는 기존 체계와의 공통점에서 인식되지 않고 다른 점에서 구별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온갖 우상숭배와 거짓종교를 근절하는 정부의 의무는 칼빈주의의 발견물이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교 황제들로부터 당했던 종교적 핍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로마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황제가 옹호했던 것이다.
로마교회나 루터교와 달리 칼빈주의의 숨결이 닿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자유 교회들이 발전되었고, 그런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루터교도나 로마교도들도 자유롭게 그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다. 칼빈주의가 가시적 교회의 모든 절대적 특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은 비록 여전히 진리의 고백과 절대 진리를 동일시하였지만, 칼빈주의는 개인의 확신이 참된 가운데서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카이퍼는 이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행정관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는 모든 의도를 억제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들에 대해서는 “각 교회(교단)들에 대하여 개별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교회들의 개별 영역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정부에게 진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모든 행정관의 판단이 교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참된 교회로서 자신의 특성을 결정하고 자신의 신앙고백을 진리의 신앙고백으로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지 국가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국가 안의 자유로운 교회”만이 칼빈주의 관점이다.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서로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 제한한다.
또한 개인의 신앙에 관해 정부는 “개인적 영역에서 갖는 주권적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이는 “양심은 결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언제나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심이 바로 “각 사람의 개인적 영역의 주권”이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믿지 않는 다수와 동의해야 하는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 반면에 칼빈주의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확신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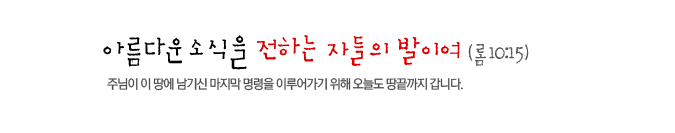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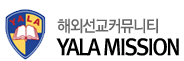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