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목회와 신학은 분업인가
그들은 신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할수 없는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이상한 분업 체제(?) 같은 것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신학을 아는 지식이 해박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곧 신앙적인 정서와 열정을 상실하고 냉담하고 직업적인 학자가 된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논리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는 당연히 매우 낯선 것이었다.
요점은 이것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룩한 정서와 열정을 함께 배우지 못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필수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거룩한 경건을 불러 일으킨다. 단지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경건한 신학자들의 성경과 학문 연구의 유산들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지식이 곧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 업적들과 신학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며, 그들이 어떻게 신학하였는가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의 진리를 예리하게 주석해 나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긴 탄원으로 이어지는 칼빈의 주석이나, 자신의 저서 [프롤로그(Prologue)]속에서 신(神)의 증명을 기도로 시작하던 안셀름(Anselm)을 생각해 보라.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고, 삶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획득하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담대함과 거룩한 갈망이 넘쳐흐르는 루터(Martin Luther)나 오웬(John Owen)의 글들을 보라.
17세기 이후의 영국의 청교도 계통의 많은 성학(聖學)들의 생애를 살펴보라. 신학은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영적으로 경험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러한 체험적인 특성을 가진 종교였다. 그래서 크라일사이머(A. J. Krailsheimer)는 이같이 말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경험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지적인 체계도 아니고 법적인 규약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인 예수의 삶과 죽음과 교훈에 대한 확실한 증언 위에 기초해 있으며, 그런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체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에 일치된 체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국외자들에게는 기독교의 2천 년 역사가 지적인 체계와 도덕률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종교가 제도화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없는 교회는 건전한 사교 모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기독교는 전설의 집합체로 전락하게 되고 윤리와 형이상학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재미있는 것은, 작은 신학자들은 신학 자체를 공부하면서 태어났지만, 교회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문적인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시대가 심어준 신학적인 편견과 무지로부터 해방될 때 위대한 신학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들 안에 한결같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거룩한 열정의 체험이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신학자가 되는 것은 독서하고 명상을 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다. 진리를 향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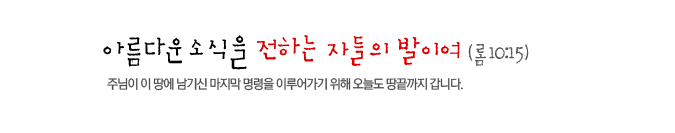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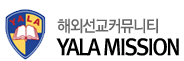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