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은 “미래의 씨를 육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1541년부터 신학교육 기관 설립을 준비하던 중 1559년 5월 소의회의 대학설립 허가를 얻고 6월 2일 공식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 구라파 여러 개혁교회에 편지를 보내,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이들을 훈련하여 복음에 불타는 사역자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신학교육의 의의를 해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육은 한 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교사’ (praeceptor Germaniae)라고 불리는 멜랑흐톤은 신학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혼돈이나 회의론 혹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철학을 신학을 위한 예비적 학문으로 여겼고, 계시가 신학의 원천이며, 생래적 개념(innate idea)과 논리적 추론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과 역할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학연구에 있어서 중생된 이성의 사유활동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일차적으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개혁자의 삶을 살았고, 개혁신앙에 기초한 신학교육이야말로 교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그가 제네나에서 훈련시킨 이들을 프랑스로 파송하여 프랑스 개혁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한 사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1562년까지 98명의 사역자들을 노르망디를 비롯한 샹파뉴, 브리따니 등 17개 지역에 파송하여 59개 처 혹은 60개처 교회에서 일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 엄청난 탄압과 박해 하에서도 프랑스개혁교회를 세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학교육의 중요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을 극복하고 계시의존적인 바른 신학의 확립이었습니다. 16세기 로마가톨릭과 이단 혹은 이설들에 대항하여 무엇이 바른 신학인가를 구분하고 드러내는, 박형룡 식으로 말하면, 획별차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신학을 학문으로만 여기지 않고 실천적인 어떤 것,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 The Marrow of Sacred Divinity』에서 그 희미한 흔적을 보이지만, 화라느이 보에트(Gisbert Voet) 화란 유트레히트대학교수 취임강연 “학문과 결합된 경건에 대하여”에서 경건을 금욕주의와 다른 영적인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학문(scientia)의 원천은 계시이지만 이 계시를 설명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신학자의 의무라고하여 삶의 문제를 신학교육의 또 하나의 축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베르린대학 교수였던 니안더(August Neander)에게 와서는 이 점은 더욱 선명해 집니다. “신학자를 만드는 것은 가슴(영혼)이다”라고 하여 소위 ‘영혼의 신학’ 을 제창한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 혹은 신학교육은 학문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삶을 위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양자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신대 이상규 박사가 개혁신학회에서 발표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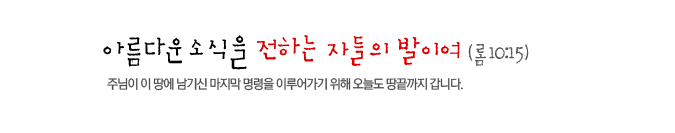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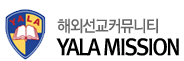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강의동영상 전체모음




